인류 역사에 전쟁은 거의 항상 있었다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로, 전쟁은 끝없이 일어났다. 그런데, 1910년대 이전까지는 전쟁 자체에 반대한다는 생각은 거의 없었다.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어느 편에 서야만 했다. 예를 들어 1592년 일어났던 일본과 조선의 전쟁에서, 조선의 ‘백성들’은 조선 편에서 싸워야 했다. 일부는 일본 편에 붙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 전쟁에 대해 생각한다면, 우리는 대개 침공했던 주체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군대가 악이었고, 그의 병력에 맞서 싸웠던 이들이 선이었다고 말한다.
그런데 1914년에 일어났던 소위 1차 세계대전은, A와 B가 싸우면 둘 중의 하나가 올바르며, A와 B 중 한편을 지지해야 한다는 오랜 생각을 헛것으로 만들었다. 왜냐하면, A와 B 모두 나쁜 놈들이었기 때문이다. 식민지를 많이 가진 제국주의 국가와 그 국가로부터 식민지를 빼앗으려는 제국주의 국가가 전쟁을 벌인다면 둘 다 ‘나쁜’ 것이고, 올바른 태도는 둘 중 하나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둘 모두를 규탄하고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 될 것이다.
제국주의 전쟁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낸 대표적인 이는 레닌이었다. 그리고 그런 이는 영국에도 있었다.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영국의 시인 윌프리드 오웬은, 전쟁이 일어나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라고 선동하던 다른 시인들과 달리, 이런 시를 썼다.
| Dulce et Decorum Est
BY WILFRED OWEN Bent double, like old beggars under sacks, 자루를 짊어진 늙은 거지들처럼 구부러진 몸으로, Gas!(주2) GAS! Quick, boys!—An ecstasy of fumbling 가스! 가스! 빨리 방독면 써! 더듬기의 절정. In all my dreams before my helpless sight, 내 모든 꿈속에서 나의 무력한 시야 앞에서, If in some smothering dreams, you too could pace (주5) 어떤 숨 막히는 꿈속에서라면, 당신 또한 |

사진: 방독면을 쓴 영국 병사들(1차 세계대전)
누군가가 말했다. “전쟁은 늙은이들의 탐욕을 위해 젊은이들이 죽는 일이다.”라고. 호라티우스의 이 말 “Dulce et decorum est pro patria mori.”는 조국을 위해 죽는 것은 영광이라는 생각을 많은 이들에게 심어주었었다. 그런데 정말 그러한가? 그의 죽음으로 인해 그 국가가 승리했다고 가정하자. 전쟁 승리의 과실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이순신과 그의 용감했던 장병들의 죽음은 무엇을 이루어냈는가? 조선의 ‘백성’들은 영광스러운 죽음의 결과로 태평성대와 쌀밥과 고깃국을 얻었는가?
이 시는 시의 역사에서뿐 아니라, 인류의 ‘생각’의 역사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시다. 호라티우스의 이 말은 수천 년 동안 유럽인들에게 영향을 끼쳤었는데, 이 시의 발표 이후로 조국을 위해 죽는 것은 달콤하다는 말은 조롱받기 시작했고, 전쟁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이가 늘어나게 되었다. 하지만 이 탐욕스러운 종자들-유럽 각국의 지배 계급들-은 또 한 번 세계적인 전쟁을 벌인다. 그 결과를 여러분은 알 것이다.
UN의 설립은, 전쟁을 쉬운 일이 아니게 만들었다. 그 전에는 기습 공격이 아니라 선전포고를 한 후 전쟁을 벌이는 것은 국제법상 적절한 일이었고, 비난받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질서에서는, 전쟁은 UN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일이 되었다. 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 다섯 국가가 전원 합의하지 않으면 분쟁을 해결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전쟁은 또다시 일어난다. 1950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전쟁은 3년을 끈 후 ‘휴전’되었다. ‘종전’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미국 등이 한국에 병력을 파견한 것은 ‘정의로운’ 일이라는 평가를 미국 내에서 받았다. 그런데 보통 미국인들이 보아도 좀 이상한, 미국의 ‘삐딱한’ 것들이 보기에는 말도 되지 않는 전쟁이 벌어졌다. 바로 미국과 베트남의 전쟁이었다. 미국은 1964년에 통킹만 사건을 조작하며 베트남의 내전에 개입했고, 이 전쟁은 1973년까지 이어졌다.
전쟁에 참여했던 미국은 정당하지 않았을뿐더러, 참전 병사들은 대개 어렸고, 정신병을 앓는 상태로 돌아오기도 했고, 시체로 돌아오기도 했다. 이에 미국의 대중 음악인들은 여러 시도를 한다. 그들은 노래를 만들었고, 반전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몇 가지 반전 음악을 들어보자.
먼저 밥 딜런의 <Blowing in the Wind>이다. 이 노래는 번안되어 트윈 폴리오(송창식, 윤형주)에 의해 불렸을 정도로 잘 알려진 노래였다. 물론 두 곡 모두 유신 시대에 금지곡이 되기는 했지만. 이제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알려진 딜런의 가사를 읽어보자.
| (관련 동영상)
How many roads must a man walk down 사람은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 내려가야 하는가,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 in the wind 친구여, 그 답은 바람 속에 불고 있어. Yes, and how many years must a mountain exist 그래, 그리고 산은 몇 년 동안 존재해야 하나,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 in the wind 친구여, 그 답은 바람 속에 불고 있어. Yes, and how many times must a man look up 그래, 그리고 사람은 몇 번이나 고개를 들어야 할까,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 in the wind 친구여, 그 답은 바람 속에 불고 있어. |
이 노래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두 번째 부분은 나중에 삽입되었다고 한다. 두 번째 부분은 미국 흑인의 현실에 대해 못 본 척하는 미국 사회 주류들을 염두에 두고 쓴 것으로 여겨진다. 나머지는 구구하게 설명하려 하지 않겠다. 그의 가사는 간결하고, 하고자 하는 말은 분명하다. 1960년대의 미국인들도, 21세기의 한국인들도 공감할 수 있는 노래라고 생각한다.

Jimmy Hendrix(1942년 11월 27일 ~ 1970년 9월 18일)
가사가 없는 반전 음악. 이를 상상할 수 있는가? 게다가 그 음악은 다름 아닌 미국 국가이다. 미국 국가가 반전가요? 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한 이가 있다. 그는 바로 지미 헨드릭스이다. (관련 동영상)
그의 미국 국가 연주는 조금 색다르지만 그래도 원곡의 멜로디를 따르는 듯 출발하지만, 기타 소리는 갑자기 기관총 소리로 변하고, 어느 순간에는 폭탄 투하를 연상하는 소리로 변한다. 미국이라는 국가의 폭력성을 고발하고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일을, 미국 국가를 변형하는 것에 의해 시도한 그는, 그 곡 연주만으로도 불멸의 업적을 남겼다고 할 수 있다. 불행히도 그는 재니스 조플린과 마찬가지로 27에 때 세상을 떠났다.
믿기 힘든 이야기 하나를 하면, 나는 1991년에 너배너의 커트 코베인의 모습을 보며 헨드릭스를 떠올렸고(왼손잡이이면서 기타와 리드보컬을 겸한다는 점에서), 이 사람도 27세에 죽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는 1994년에 2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참고로, 헨드릭스가 미국 국가를 왜곡하는 데 주로 쓰인 도구는 트레몰로 암과 와와 페달이다. 전자는 Whamy Bar라고도 불리고, 후자는 Cry Baby라고도 불리는데, 그림을 참조할 수 있다.

트레몰로 암은 비브라토를 일으킬 수 있는 장치인데, 활용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의 시작 부분을 참조할 수 있다. (관련 동영상)
와와 페달은 ‘와와’하는 소리, 혹은 우는 소리를 낼 수 있는 장치이다. 후자를 이용한 유명한 기타 솔로로는 건즈 앤 로지즈의 <Sweet Child of Mine>, (관련 동영상) 메탈리카의 <Enter Sandman>,(관련 동영상) 지미 헨드릭스의 Voodoo Child(Slight Return) (관련 동영상) 등이 있다.
그의 또 다른 반전 음악은 제목 자체가 기관총(Machine Gun)이다. (관련 동영상)
이 음악에서는 기관총 소리를 연상하게 하는 연주가 몇 분 동안 이어진다.
베트남 전쟁의 시기가 지났고, 또 시간은 흘렀고, 새로운 천년이 도래했다. 그래도 전쟁은 계속되었다. 대표적인 21세기의 전쟁은 제2차 걸프 전쟁이라고 미국인들이 주로 불렀던 미국과 영국 등의 이라크 침공 전쟁이었다. 이라크 침공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클린턴이 백악관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모니카 르윈스키와 성관계를 가진 것이 밝혀지고 탄핵에 직면했을 때 이루어졌던 때 일어났던 바그다드 폭격이었고, 그 후 (아들) 부시 정권 때는 ‘대량 살상 무기’를 명분으로 전면적인 침공이 일어났다(2003). 미국 가수 존 멜렌캠프는 이 꼴을 보기 힘들었는지, <워싱턴 당국에게>라는 노래를 불렀다. (관련 동영상)
| To Washington
John Mellencamp
Eight years of peace and prosperity Scandal in the White House An election is what we need From coast-to-coast to Washington
So America voted on a president No one kept count On how the election went From Florida to Washington
Goddamn, said one side And the other said the same Both looked pretty guilty But no one took the blame From coast-to-coast to Washington
So a new man in the White House With a familiar name Said he had some fresh ideas But it’s worse now since he came From Texas to Washington
And he wants to fight with many And he says it’s not for oil
He sent out the National Guard To police the world
From Baghdad to Washington What is the thought process To take a human’s life What would be the reason To think that this is right
From heaven to Washington From Jesus Christ to Washington |
이번에는 한국의 반전 음악을 몇 곡 살펴보자. 다음의 노래가 반전 음악인지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대개는 남한과 북한 간의 전쟁을 피하자는 목소리를 낸 것이라고 해석한다. 김민기의 <작은 연못>이다. (관련 동영상)
| 작은 연못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푸르던 나뭇잎이 한 잎 두 잎 떨어져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
이렇게 서정적인 반전가요도 있지만, 매우 직선적인 가사를 담은 노래도 있다. 사실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노래인데, 사람들의 죽음을 떠올리는 것은 참 싫은 일이기 때문이다.
| (관련 동영상)
제국의 발톱이 이 강토 이 산하를 |
사실 <김민수전>을 쓰게 되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이 노래와 관련된 어떤 경험이었다. 어느 날 대치동 어느 학원의 원장은, 신림사거리에서 자신의 눈앞에서 죽어갔던 ‘세진이와 재호’를 언급하며 내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울고 난 그는 잠시 후 세금 포탈 방안을 논하더니, 술 마시러 가서는 가상화폐와 부동산 ‘투자’ 얘기를 한 시간이나 하더니, 2차를 유흥주점으로 가자고 했다.
이 노래를 부르며 눈물 흘리던 많은 이들은 이제는 지배 계급이 되었다. 자신들이 대학생 때 비난했던 이들처럼 살고 있다. 그래서 이 노래는 더 슬프다.
다시 오웬의 시 구절을 생각한다. 전쟁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열아홉, 스물의 젊은이들에게, 젊은이들을 머릿수로만 파악하던 ‘위정자’는 말했을 것이다. “조국을 위해 죽는 것은 달콤하고 올바른 일이다.” 그러나 전쟁의 참혹함을 온몸으로 느꼈던 시인은 말했다.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The old Lie: Dulce et decorum est pro patria mori.”
<주석>
1. ‘지랄탄’을 경험하신 분은 그 휙(영어로 hoot) 비슷한 소리를 기억할 것이다.
2. “Gas!”는 방독면을 쓰라는 군대의 명령어이다. 한국 군대에서도 ‘가스!’가 쓰인다.
3. 방독면을 쓰라는 ‘가스!’ 명령을 받은 군인은 헬멧을 벗고, 그 헬멧을 소총에 걸고, 소총을 다리 사이에 끼운 후, 방독면을 꺼내 쓰고, 마지막으로 헬멧을 다시 쓴다. 그것이 ‘가스!’ 명령에 대한 복종의 완성이다.
4. 이 문단의 시제는 현재형이다. 즉, 전쟁 당시의 일은 악몽이 되어 계속 화자를 괴롭히고 있다.
5. 가정법 문장이다. 당신도 그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자신과 같은 경험을 가졌다면, 그 누구라도 전쟁에 찬성하는 발언을 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점을 오웬은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6. 홍채 부분은 보이지 않고 흰 부분만 보이는 소위 ‘까뒤집어진 눈’.
7. “Dulce et decorum est pro patria mori.”는 로마 시인 호라티우스(영어 이름은 Horace)의 Odes에 나오는 구절이다. “조국을 위해 죽는 것은 달콤하고 적절하다.” 정도의 의미이다. 라틴어 patria는 원래 아버지를 뜻하는 말이었는데, 조국이라는 뜻으로도 쓰였다. 영어 patriot(애국자,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 patriarch(가부장) 등의 단어들의 어원이다.
https://en.wikipedia.org/wiki/Dulce_et_decorum_est_pro_patria_mori
pro는 ‘찬성하는’의 의미로, 예를 들어 pro-communist를 한국의 공안검사들은 ‘용공 분자’라고 불렀다. dulce는 현대 이탈리아어에서는 dolce가 되었다. 이병헌, 김영철이 주연을 했고 신민아 등이 조연을 했던 영화 <달콤한 인생>에 나오는, 이병헌이 주로 지내는 카페의 이름은 ‘La Dolce Vita’였다. 말 그대로 ‘달콤한 인생’이라는 뜻이다.
8. 클린턴 행정부 때의 ‘모니카 르윈스키 스캔들’. https://ko.wikipedia.org/wiki/르윈스키_스캔들
https://en.wikipedia.org/wiki/Clinton-Lewinsky_scandal
링크 이름을 보니 한숨이 나오는데, 영어 위키는 ‘Clinton-Lewinski_scandal’인데 한국 위키는 ‘르윈스키_스캔들’이다. 위키 백과를 만드는 데 참여하는 분들의 성 의식이 이 정도 수준이라니.
9. 당시 플로리다 주지사는 조지 w 부시의 동생이었는데, 플로리다 주의 부정 선거 때문에 부시가 당선되었다는 얘기가 많이 떠돌았다.
10. 미국의 보수주의자들 중 ‘매파’라고 불리기도 했던 전쟁광들은 거의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 아버지 부시와 아들 부시는 그 대표적인 이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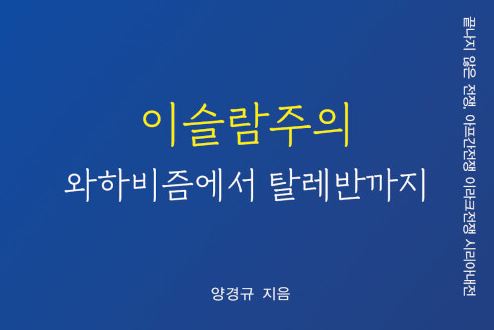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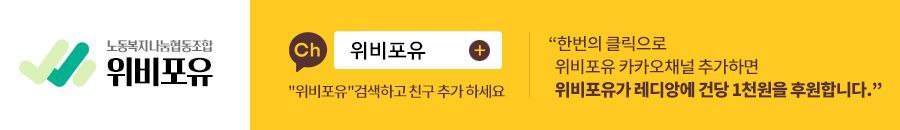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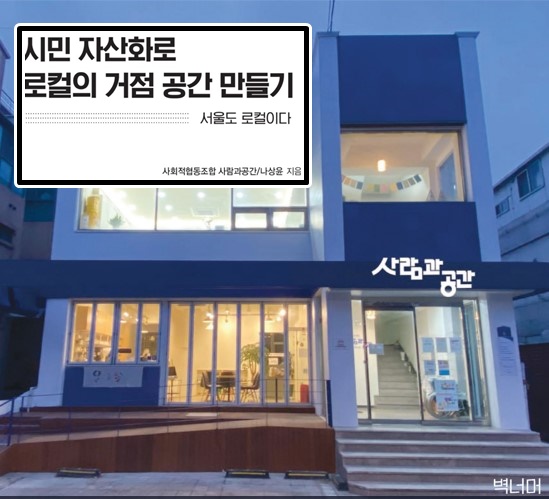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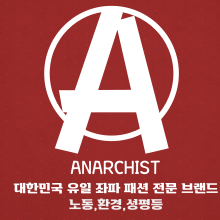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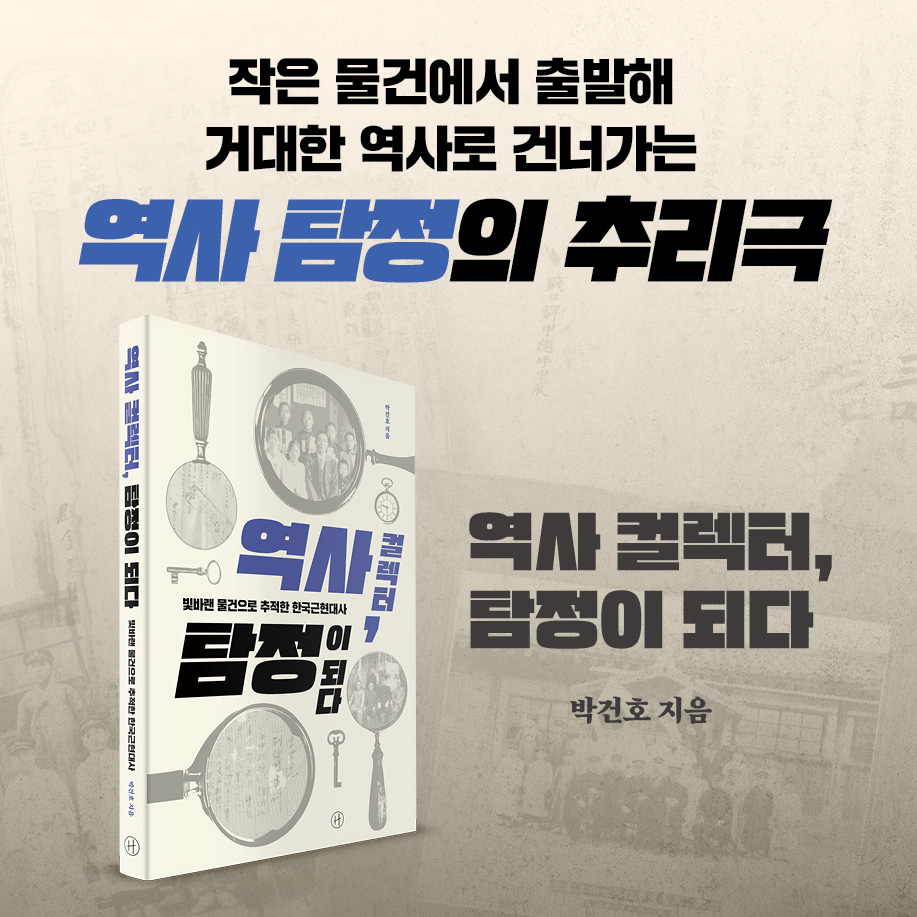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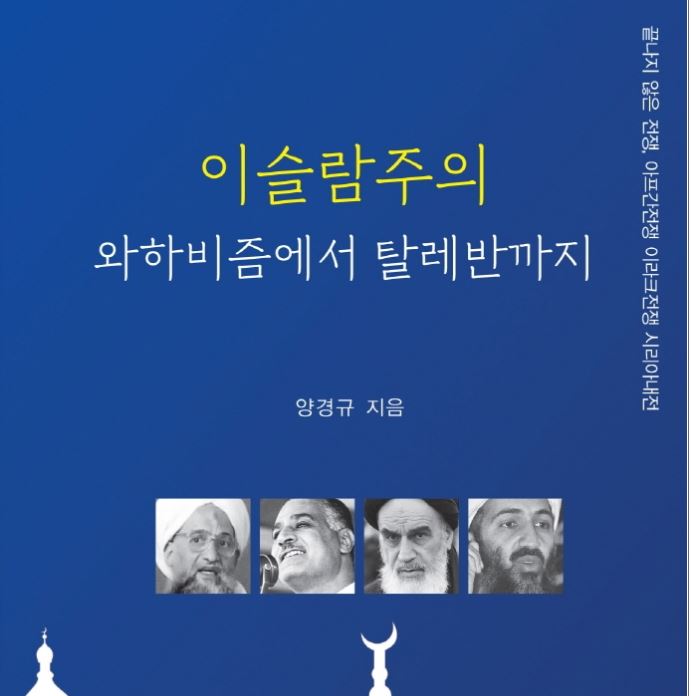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