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순 시장이 자신의 시장 취임식을 여러 시민들의 재능기부를 받아 비용 제로인 행사로 치르겠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재능기부라는 말의 이면에 있는 ‘공익’이라는 것과 ‘노동 착취’라는 점에 대한 문어님의 페이스북 글을 필자 동의를 얻어 게재한다. <편집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능기부를 받아 취임식을 한다는 뉴스(관련 링크)가 뜨자 말들이 많다. 취임식에서 사회자는 20대 취준생이 맡고, 애국가 반주는 어린이 오케스트라가 하고, 아마추어 가수가 선창을 하고, 주부와 장애인은 진행요원을 맡는다고 한다.
‘재능기부’란 노동 착취를 좀 세련되게 부르는 기만적인 이름이 아닌가 하는 물음은 꽤 오래된 것이다. 박시장이 예전 희망제작소 시절에 무급인턴 문제로 논란이 되었는데,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공짜 재능기부를 당연시하는 문화가 퍼지면서 애꿎은 해당 업계 종사자들이 피해를 본다. 특히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에 속하는 문화예술인들의 불만이 많은데, 이들은 재능기부를 ‘갑’에 해당하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유형, 무형의 압력으로 느낀다. 이번에 공짜로 너의 글을, 그림을, 노래와 춤을 행사에 제공해 달라, 그것이 곧 너의 스펙이 되니 서로 윈윈이지 않느냐는 압력이다.
지적, 예술적, 무형의 노동은 돈으로 따지는 것이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문화, 이명박이 “서울시 오케스트라가 민주노총에 가입돼 있었다. 아니, 음악하는 사람들이 민주노총에 가 있는데, 그것도 전에는 금속노조에 가 있었다, 아마 바이올린 줄이 금속이라서 그랬나 보다”고 말했던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에 우리 사회는 머물러 있다.
문화예술인들의 재능기부에 대한 반감은 그것을 자칫 자신들의 생존권의 위협으로 여길 만큼 절박한 처지에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물론 재능기부나 자원봉사가 필요한 영역은 실제로 존재한다. 국경없는 의사회 같은 단체들은 재능기부의 적절한, 그리고 필요한 예일 것이다. 오랜 시간과 금전을 투자해 얻은 전문성과 기득권을 기부의 형식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행위는 사실 장려할 만하다.
보통 재능기부는 talent donation이라고 영역하는 듯한데, 영어권에서는 용례가 없는 콩글리시(?)인 것 같다. 영어에서 이에 해당되는 이름은 ‘프로 보노'(pro bono, 본디말로는 pro bono publico)인 듯한데, 이는 ‘공익을 위함’이란 라틴어 문구이다.
주로 법조인들의 무료 법률지원 등 전문가 계층의 사회봉사를 고상하게 부르는 명칭이다(라틴어나 한문 따위를 아직도 좋아하는 녀석들이 법조인이나 의사들 말고 누구겠는가! ㅋ)
이런 영역과는 달리 서울시처럼 세금을 ‘쓰는’ 일을 본업으로 하는 지자체가 스스로 재능기부 받는 일을 당연시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떨떠름한 모습이긴 하다.
여기에는 ‘프로 보노’, 즉 공익의 원칙이 없다. 박시장 취임식 자체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박원순이건 오바마건 특정 정치인의 취임식에 자신의 노동을 기부하는 일을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일로 보기는 힘들 것이다. 그것은 명백한 정치적 행위다. 하나의 정치참여로서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로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또 한 가지, 취임식 예산을 아끼면 실제로 서울시의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그 이익이 돌아갈 것인가? 워낙 방만한 지자체들이 많다 보니 ‘예산을 아낀다’는 것이 마치 일종의 절대선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그렇게 아낀 예산을 실제로 어디다 썼는가 하는 것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다.
어떻게 아꼈는가보다 어디다 얼마나 썼는가가 초점이어야 할 것이다. 기초의원들의 활동과 시민사회의 서포팅 또한 ‘걔들이 이렇게 함부로 돈을 쓰더라’는 공분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반드시 뭔가를 따내야 한다’는 절박성이 중심이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어떤 단체에 재능기부나 자원봉사를 고민한다면, 그 일이 ‘누구에게 이익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기부금을 받아놓고 삥땅을 치는 건 아닌지, 혹시 누군가의 업적으로 쓰이기 위한 전시용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의료지원이나 법률지원처럼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벽화 그리기나 칼럼 쓰기, 강연 같은 애매한 경우들은 대개 그 노동을 섭외하는 집단 자체를 유지하고 키워주는 데 쓰이는 노동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키워야 할 집단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서울시를, 박원순을 그렇게 키워야 할까? 그것은 당사자의 정치적 판단에 따를 부분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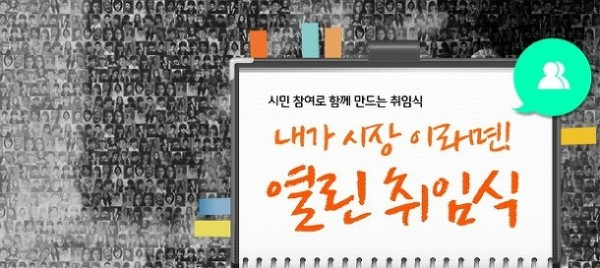





페이스북 댓글